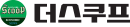위기를 극복할 방안이 수차례 마련됐음에도 유로존 위기는 여전하다. 유로존 회생의 열쇠를 쥐고 있는 독일에 이어 프랑스까지 경기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유로존 가입에 부정적인 국가까지 등장하고 있다. 유로존 재정위기가 유로존 회의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유로존 위기가 벼랑 끝으로 치닫던 12월 13일. 유럽연합(EU) 재무장관은 유로존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안건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유럽중앙은행(ECB)에 유로존 은행들에 대한 단일 감독권을 부여한 것이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14시간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이뤄진 합의다.
막판까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던 프랑스와 독일은 대승적 차원에서 한발자국씩 양보했다. 프랑스는 유로존 6000개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감독을 시행하자고 요구했다. 독일은 다국적 대형은행부터 감독을 하고 단계적으로 넓혀가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확정된 합의안에 따르면 ‘유로존의 상설 구제기금인 유로안정화기구(ESM) 등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 ‘자산규모 300억 유로(약 42조465억원) 이상인 은행’ ‘자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자산 비율이 20% 이상인 대형은행’이 ECB 산하에 설치되는 단일 은행감독기구의 감독을 받는다. 독일의 중소 지방은행·저축은행은 감독 대상에서 제외돼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정치적 부담이 줄어들었다.
이를 통해 유로존 재정위기가 해결국면에 다다랐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반론도 많다. 메르켈 총리는 유로존 위기가 향후 몇년간 계속될 것이라 전망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위기에 빠진 은행과 손실을 입은 투자자의 예금을 보호하기 위해 자금지원이 필요한데, 이 자금을 어디서 끌어올지에 대한 논의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유로존 내 부실은행에 대한 ESM의 직접적인 자금지원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프랑스와 스페인은 ECB가 부실은행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통로를 빨리 만들자고 주장한다. 반면 독일은 ECB 감독기능이 완전히 자리를 잡은 후 자금지원책을 만들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로존 재정위기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독일이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ESM의 은행 지원책은 2014년 후반에나 가능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독일 건설·산업생산량 급감 ‘충격’
이에 따라 유로존의 경기회복 속도는 내년 하반기까지 매우 느릴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지표 역시 썩 좋은 편이 아니다.
EU 통계청에 따르면 올 10월 유로존 건설 부문 생산은 전월보다 1.6% 감소했다. 9월 1.3% 감소한 후 두달 연속 감소다. 특히 독일의 건설 부문 생산이 5.3%나 급감한 것은 문제다. 프랑스 역시 1.1% 감소해 9월 0.5% 감소한 이후 두달 연속 감소했다.
유로존의 10월 산업 생산량도 전월보다 1.4% 감소해 두달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독일의 산업 생산은 2.4%나 감소했다. 올 들어 최대 감소폭이다. 전월보다 0.6% 감소한 프랑스 역시 두달 연속 감소를 피하지 못했다.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유로존에 대한 어두운 전망은 계속되고 있다. 유로존 가입을 원하던 라트비아·불가리아·폴란드·체코는 유로존 가입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가 유로존 회의론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강서구 기자 ksg@thescoop.co.kr | @itvfm.co.kr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