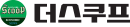파산 위기에 빠진 기업을 회생시켜 주는 법정관리제도. 죽어가는 기업에게 ‘재기’의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좋은 경제시스템이다. 하지만 경영실패의 도피처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단점도 있다. 법정관리의 허와 실을 짚었다.

둘째 문제다. “경영인 또는 관계인이 법정관리 신청 전 자금을 빼내거나 주식을 매각하는 등 부도덕하거나 불법 행위를 저지른다.”
최근 웅진그룹 사태로 부실기업의 ‘법정관리’가 논란이 되고 있다. 법정관리의 공식용어는 기업회생절차다. 말 그대로 파산 위기에 빠진 기업을 정부가 회생시켜 주는 시스템이다. 역할은 법원이 맡는다.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은 법원 심사를 거친 후 인가를 받는다. 이후 회사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해 법원이 최종 수정•확인 후 회생절차가 진행된다. 여기서 법정관리인이 선임된다.
그렇다고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모든 기업이 법정관리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업의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아야 한다. 회사를 팔았을 때의 금액보다 회생시켜 운영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커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 법정관리제도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지적된다. 기업을 부실하게 만든 책임이 있는 기존 경영진이 경영권을 유지하는 게 하나다. 둘은 법정관리 신청 전 자산 빼돌리기다.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 유지 장치는 2006년 마련됐다. 통합도산법과 함께 ‘기존관리인 유지(DIP•Debtor In Possession)제도’가 도입되면서다. 과거에는 기존 경영진이 아닌 제3자가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됐다. 법정관리 절차에 돌입하면 기존 경영진이 경영권을 잃었다는 의미다.
때문에 기업은 계속 부실을 안고 버티다 파산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래서 정부는 기존 경영진이 재산유용•은닉 등 중대한 위법 사실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경영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내놨다.

경영권 박탈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 더 많은 부실기업이 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게 한다는 취지였다. 회사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기존 경영인이 회생절차를 맡아야 효과가 크다는 장점도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06년 후 5년간 법정관리가 시행된 기업(대출 200억원 이상) 142개사 중 120개사(84.5%)는 기존 경영인이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됐다.
하지만 이 제도는 경영 실패의 ‘도피처’로 악용되고 있다. 부실을 저지른 경영인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준 것이다.
철저한 계산 하에 법정관리 인가를 받을 수 있다면 기업도 살리고, 경영권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다.
문제는 부실 경영의 책임은 있지만 이에 대한 질책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기존 경영인이 재산 유용•은닉을 하지 않았거나 그들이 부실의 막대한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만 없으면 경영 실패의 행적은 조용히 묻힐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존 경영인은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며 법정관리인의 자리에 오른다. 이 과정에서 비난을 받거나 논란이 일면 최대주주인 오너 경영인은 뒤로 살짝 빠지고, 오너의 측근인 기존 경영인 중 한명을 법정관리인에 선임하면 그만이다.
실제로 윤석금 회장은 법정관리 신청(9월 26일) 후 웅진홀딩스 대표이사에 취임하려 했다.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가는 웅진홀딩스의 경영을 맡기 위해서다. 하지만 채권단, 개인투자자들의 비난이 일자 대표이사에 오르지 못했다. 이후 윤 회장은 그룹 경영에서 손을 뗀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 회장과 함께 웅진홀딩스를 이끌었던 신광수 대표가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됐다. 부실을 일으킨 오너가 법정관리 과정에서 이뤄지는 모든 기업경영 활동에 나서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비자금 조성, 차명계좌 운용 등 의혹을 받고 있는 삼환기업 역시 기존 경영인이 법정관리인을 맡고 있다. 삼환기업은 7월 16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최용권 회장과 함께 기업 경영을 담당했던 허종 사장이 법정관리인을 맡고 있다. 홍순관 삼환기업 노조위원장은 “기존 경영인이 과거 부실을 저질렀고, 이런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들이 또 경영권을 얻었다”며 “이 사람들을 믿으며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경영권 유지 관련 제도가 악용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외국과 달리 국내기업 대부분은 소유주(최대주주)와 경영인이 동일하다. 예컨대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한 웅진그룹 윤석금 회장은 경영인이자 그룹 지주사인 웅진홀딩스의 지분 73.92%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때문에 법정관리가 진행돼도 오너가 다시 경영을 맡으니 효과적인 회생절차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경영권 유지 선상에서 회생절차가 진행될 수밖에 없어 회계투명성 개선작업이 부진할 수도 있다.
한 시중은행 기업회생절차•구조조정 담당자는 “법정관리가 기업을 살려주는 회생절차라고 하지만 (기업 전체가 아닌) 오너, 경영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주변 이해 관계자들의 상황과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기존 경영진에게 경영권을 준다’는 제도가 악용되면서 또 다른 문제도 파생되고 있다. 경영권이 유지되다 보니 법정관리 신청 전 회사 자금을 빼돌리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웅진홀딩스는 9월 19일 웅진씽크빅(250억원)과 웅진에너지(280억원)로부터 빌린 530억원을 법정관리 신청 하루 전인 9월 25일 상환했다. 만기일(28일)보다 사흘 먼저 계열사 채무를 갚았다.
때문에 ‘윤석금 회장이 법정관리 신청 전 자금을 빼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윤 회장의 부인 김향숙씨는 보유하고 있던 웅진씽크빅 4만4781주(0.17%) 전량을 법정관리 직전 매도했다. 금융감독원은 법정관리 전날 매각에 기초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인지 조사 중에 있다.
윤 회장은 “중요한 상황에서 집안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공식 사과했다. 또 그룹 차원에서 보도 자료를 내고 “법정관리와 (윤석금 회장의 부인의) 주식 매각 날짜가 공교롭게 겹쳤을 뿐, 내부 정보를 활용하지 않았고, 손실 회피를 위한 고의적인 행동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 법정관리를 신청한 LIG건설도 똑같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LIG그룹의 자회사인 LIG건설은 법정관리 신청(2011년 3월21일)을 앞둔 2월28일부터 3월10일까지 금융기관에서 약 242억원 규모의 기업어음(CP)을 부정 발행했다. 부도처리가 될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발행한 것이다.
검찰은 사기성 CP 발행 혐의로 구자원 LIG그룹 회장과 두 아들(장남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차남 구본엽 LIG건설 부사장)을 조사했고 10월 31일 구본상 부회장을 구속했다.
법정관리 신청 전 ‘자금 빼내기’
이처럼 법정관리가 경영권 유지를 위해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재풀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세현 법무법인 정곡 변호사는 “회사 경영에 대해 잘 아는 경영자측 한명, 자금 관리하는 채권단측 한명, 이를 감시•총괄하는 법원측 한명 등 공동관리인을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법정관리 진행기간인 10년도 너무 긴 측면이 있다”며 “법정관리 돌입 후 2~3년이 흐르면 중간평가를 해서 이행정도가 충분치 않으면 관리인을 변경하는 등 다양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정관리신청이 채권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와 논의를 마친 뒤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법정관리 신청 전 기존 경영인이 자금을 빼내는 등의 불법 행위를 사전에 견제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최근 법정관리 개선 방안 검토에 나섰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0월 4일 “이해관계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 구조조정제도(워크아웃•법정관리 등) 전반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20일이 흐른 10월 24일 현재 이렇다 할 개선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지만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박용선 기자 brave11@thescoop.co.kr|itvfm.co.kr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