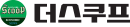죽음의 계곡 넘은 스타트업들

미국에서 산업디자인을 전공한 이성원 이지웍스유니버스 대표는 오래 전부터 ‘자신의 재능이나 경력을 비주얼(Visualㆍ시각자료)로 표현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했다. 그가 모바일에 사진ㆍ작품 등을 올려 포트폴리오(이력서)를 만들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시제품 형태로 만든 이유다. 하지만 진짜 앱으로 구현하려면 돈이 필요했다. 다행히 2012년 퀄컴에서 주최하는 큐프라이즈 지역대회에서 우승해 10만불의 상금을 받았다.
이 돈은 그의 아이디어가 실현되는 ‘밑거름’이 됐다. 이 대표가 만든 시제품은 지난해 9월 정식버전 ‘비쥬메’로 탄생했다. ‘창업붐’이 거세다. 2010년 2만4645개였던 벤처기업은 해마다 꾸준히 늘면서 지난해 2만9135개로 늘어났다. 이유는 여러 가지다. 산업 패러다임이 전기ㆍ전자ㆍIT(정보기술)로 넘어가면서 게임이나 메신저, 앱 하나만 잘 만들어도 대박을 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창업시장에 흐르는 ‘빈익빈 부익부’
투자환경도 좋아졌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2009년 국내 벤처캐피탈의 신규 투자액은 8671억원에서 지난해 1조3845억원으로 증가했다. 엔젤투자자 수도 크게 늘었다. 엔젤투자협회에 등록된 엔젤투자자 수는 2011년 369명에서 올 6월 6311명으로 17.1배가 됐다. 퀄컴ㆍ소프트뱅크 같은 글로벌 기업도 국내에 벤처캐피탈을 세우고 스타트업을 발굴해 투자하고 있다.

지난 1년간 미래창조과학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고용노동부ㆍ국토교통부ㆍ중소기업청 등 정부부처는 총 1조5000억원 규모의 청년창업지원자금을 풀었다. 하지만 이런 혜택을 누리는 스타트업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를 꺼리는 분위기가 여전하다. 국내 상위 10개 벤처캐피탈의 업력별 투자형태를 보면 3년 이내 기업에 투자 비중은 전체 19.7%에 그쳤다.
창업시장의 저변에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깔려 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까닭이다. 요즘 스타트업을 두고 ‘그 나물에 그 밥’이란 지적도 나온다. 핵심기술보단 비슷비슷한 앱이나 게임개발에 쏠리는 경향이 있어서다. 비즈니스 모델이 비슷하거나 아이디어를 카피하는 일까지 증가하고 있다. 사실 창업시장은 만만한 곳이 아니다. 취업이 어려워서, 남의 밑에서 근무하기 싫어서 창업한 이는 십중팔구 패배의 쓴잔을 마신다.

김미선 더스쿠프 기자 story@thescoop.co.kr
저작권자 © 더스쿠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