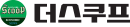2015년 시행 예정인 환경부의 ‘저탄소 협력금’ 제도에 대한 찬반양론이 팽팽하다. 저탄소 협력금제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에는 부담금을 물게 하고, 적게 배출하는 차량에는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탄소세’의 한 방법이다. 환경부가 제시한 저탄소차 협력금제 시행 기준안을 보면, 현대차의 대형차 에쿠스는 700만원의 부담금을 추가적으로 내야 구입이 가능하다. K5나 쏘나타 하이브리드의 경우는 반대로 50만원의 보조금을 받는다. 처음 시작되는 2015년의 경우 1㎞ 주행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이 101~125g에 해당하는 차량은 탄소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경소형차와 준중형차가 여기에 포함된다.
최근 저탄소차 협력금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가파르게 증가하는 디젤 또는 하이브리드 차량에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국산 대형차는 큰 금액의 부담금을 내야 하는 게 부당하다는 논리다. 여기엔 자동차 생산업체가 아닌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한다는 불만도 섞여 있다. 정부가 편한 논리로 세금을 부과하는 또 하나의 제도를 만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중대형→친환경ㆍ소형차 시장으로
그러나 이 제도는 여러 측면에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한국은 에너지의 약 97%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다. 수출로 번 돈을 에너지를 수입하는 데 쓰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럼에도 우리 소비자는 큰 배기량과 큰 차를 선호하고, 에너지가 많이 드는 급출발ㆍ급가속ㆍ급정지를 습관적으로 한다. 특히 한국의 경차 비율은 9%가량에 불과하다. 일본(37%)ㆍ유럽(50%)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에너지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제도를 통해 절약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저탄소차 협력금제는 국내 자동차 산업이 친환경 중심으로 가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자동차 산업이 충격을 받을 수 있어 완충할 수 있는 장치를 동시에 만들어야 한다.

저탄소차 협력금제가 시행되면 당연히 중대형차의 판매는 줄고, 경소형차는 늘어난다. 국민도 이산화탄소 문제에 대해 유럽인들처럼 경각심을 가질 것이다. 차량에 대한 가치도 ‘재산’적 측면에서 ‘이동수단’ 쪽으로 바뀔 전망이다. 물론 이 제도로 모이는 자금 중 일부는 전기차 등 친환경 공급에 활용될 것이다. 전기차는 완전 무공해 차량으로 현재 유럽 등 선진국은 전기차 보급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새롭게 시작하는 제도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 중요한 건 얼마나 긍정적인 면을 부각할 수 있냐는 거다. 특히 확보한 재원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친환경차 관련 사업에 제대로 활용해 신뢰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autoculture@hanmail.net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